Artlecture Facebook
Artlecture Facebook
Artlecture Twitter
Artlecture Blog
Artlecture Post
Artlecture Band
Artlecture Main
|
HIGHLIGHT
|
가상현실공간을 구성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구조는 바로 구(sphere)이다. 초기 가상현실 카메라의 리그에 달린 카메라 갯수가 6개였던 이유를 살펴보면 전-후-좌-우-위-아래 이렇게 6면이기 때문이고 각각의 6면을 이어붙이게 되면 구의 형태를 띄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구현하는 특수관에 가보면 대부분 천정은 원형으로 되어 있다.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1553년 로마에서 재건축한 판테온(Pantheon)신전을 보면 메인 홀의 천정은 반 구형태(hemi sphere)를 띄고 있으며 직경 9미터의 대형 개구부 '오쿨루스'가 있어 실내에서도 바깥 하늘을 볼 수 있게 설계 되어 있다. 바닥부터 오쿨루스(천정 중앙의 개구부)까지의 높이는 142피트(43.28미터)가 된다. 이 높이는 내부의 원형지름과 동일하다. 즉, 142피트의 지름을 가진 완벽한 형태의 가상의 구가 판테온 내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로마시대 건축술은 대칭공간에 대한 연구와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

판테온 신전의 단면도
1967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국제 엑스포에 선보인 미국관 파빌리온은 구형태를 띄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 국제 엑스포의 핵심은 과학기술과 인류의 미래 문화를 내다보는 행사인 만큼 테크놀러지를 뽐내는 건축 또한 볼거리가 된다. 당시 미국관에서는 엘비스프레슬리 가수의 공연모습, NASA의 아폴로 착륙선을 설치해서 운영하였고, 열차가 구 내부를 관통해서 갈 수 있게 설계하여 관람객들의 인기 파빌리온이었다. 그러나 1976년 5월20일에 화재가 발생하여 표면을 다 태우고 전소시켰지만 강철구조는 건재하여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현재는 바이오 스피어로 환경에 대한 전시가 가능한 공간으로 사용된다고 한다. 이 건물은 2021년에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후 건축물 25개중 하나로 소개되기도 하였고 몬트리올의 랜드마크로 남아 있다. 구 형태안에 들어간 관객들이 느끼는 생명의 감성이 어떠할지 상상해보면 바이오 스피어의 컨셉은 또 하나의 세상을 경험하게 하는 완벽한 가상현실의 구현을 꿈꾸는 듯 하다.
오사카에서 열린 1970년 엑스포에서는 돔 형태의 구조물 안쪽에 프로젝션으로 사운드와 비디오의 스펙터클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당시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을 360도 벽면 프로젝션이 구현되었다. 이 건축의 디자인은 미국 팝아트 작가인 버그민스터 풀러(Buckminster Fuller)가 설계한 지오데식 돔의 형식이다. 돔형식으로 완벽하게 관객을 가둔 전시관 내부는 벽면투사 영상과 사운드의 연출로 인해 관객으로 하여금 미래의 어느 지점에 도착한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했을 것이다.

(좌)몬트리올 엑스포67 미국관 모습 (우) 오사카
엑스포70에 선보인 지오데식 돔 건물 (페스티벌 플라자)
2018년에서 착공을 시작하여 2023년 개장한 라스베가스 스피어(Las Vegas Sphere)는 네바다 주 파라다이스에 위치한 최첨단 음악 및 엔터테인먼트 경기장으로 코로나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가상의 오디오비쥬얼 공간을 구현한다. 스피어의 외부, 즉 엑소스피어는 멀리서도 보이는 LED 라이트 패널로 장식하여 구형태의 영상을 연출하는 미디어 파사드로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달과 행성의 사실적인 묘사부터 거대한 눈동자나 할로윈 호박 같은 재미있는 디스플레이까지 다양한 이미지와 애니메이션들이 표출된다. 스피어의 내부에서는 최첨단 오디오 및 비주얼 기술을 통해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경험을 제공하는 기술을 갖추었다. 최근 U2 같은 유명 빅 밴드의 콘서트를 포함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스피어 내부의 영상은 해상도가 자그마치 18K, 초당 120프레임(fr)의 재생속도로 구현된다고 한다. 아마 일반 컴퓨터로는 이러한 해상도를 감당하는 작업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소니에서는 이 구형에 맞는 센서를 장착한 카메라를 출시하였다. 오디오 환경은 167000개의 채널로 제어되며 관객이 위치한 어떤 자리에서도 사운드가 균일하게 들리게 설계되어 이머시브 사운드를 구현한다. [4]

라스베가스 스피어에서의 U2 공연 장면 [5]
사운드를 구현하는 공간에서는 실제와 비실제, 즉 상상력이 더해진 비시각적 공간감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의 물리적 공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각적으로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 멀리 펼쳐진 빈 공간의 요소가 존재해야 효과적이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천장이 높고 주변이 넓은 공간이 소리를 반사하고 증폭시키며 전파하는 데 더 용이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결국 앞서 언급한 구 형 건축이 가진 공간의 공통점을 본다면, 구형 건축물들이 공유하는 공간적 특성을 관찰하면, 이머시브 공간에서의 경험이 단순한 오디오와 비주얼의 상호 매칭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간의 형태, 시각적 효과, 심리적 공간감이 결합되어 관객이 느끼는 시각적 공간과 환경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머시브한 공간 연출에서 공간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간의 볼륨에 따라 소리 역시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영상이든 사진이든 해당 시각적 결과물들이 건축물 내에서 어떻게 맵핑되는가에 따라 달라지며, 이 과정에서 오디오와 비주얼의 관계 사이에 공간적 요소가 추가되어 보다 포괄적인 감각 경험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디오가 공간 환경에 맵핑되는 의미와 그 발생 요소들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알아보고자 한다.

이탈리아 출신의 형이상학적 회화의 대표 화가 조르조 데 키리코의 ' The Mystery and Melancholy of Street' 이 작품을 위의 글에 사례로 들고자 한다. 움직이지 않는 회화이지만 건물 뒤에 보여지는 그림자와 공간의 표현이 소리를 연상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소리가 들릴 것 같은 청각적 그림이라 할 수 있다. 이 그림에서 표현된 공간적 특징과 여백은 소리를 발생시키는 시각 요소가 된다. 데키리코의 회화는 고요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지는 도시의 풍경을 그린다. 황량한 거리에는 그림자와 건물, 그리고 한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며 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아이와 건물 사이의 긴 그림자, 차가운 건축물의 색채와 대조되는 따스한 햇살의 색상은 모두 공간의 신비로움과 쓸쓸함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여백은 저 너머의 시선이 머무는 깃발과 그림에서 그려지지 않은 광장 같은 공간이다. 광장은 그림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흰 건물 앞에 어떤 그림자도 없으므로 넓은 광장을 상상할 수 있고 그림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넓은 광장에서의 소리는 충분히 상상 가능하다. 그림 속 광장은 직접적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건물 사이의 틈새, 불규칙한 그림자, 그리고 도로의 연장선 등은 광장의 존재와 울림을 암시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적 단서들은 하나 둘 씩 모여서 화면에서 보는 이로 하여금 광장의 분위기와 소리, 심지어 그림 속 안에서의 어떤 움직임까지도 상상하게 만든다. 이는 공간이 가진 '음향적' 특성을 느끼도록 유도하며, 보이지 않는 공간 이 가지는 '소리'의 특질을 관객 스스로가 채워 넣게 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은 아마도 거리에서의 소리, 예를 들어 아이의 발걸음 소리나 굴렁쇠를 굴리는 소리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들리지 않는 소리'를 상상하게 만들어서 더욱 증폭되는 효과를 가진다. 기대하는 소리와 실제와의 차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조르조 데 키리코의 그림들은 건축물과 그림자를 사용하여 특정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이른바 ‘형이상학적 회화’라고 명명되어진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은 소리의 부재를 더욱 강조하고 있으며, 관객으로 하여금 조용한 환경에서 느낄 수 있는 고독과 반성의 순간을 상상하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들은 사운드 디자인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공간적인 특징과 시각적 여백은 관객이 작품을 경험하는 동안 내적인 소리와 감정을 탐구하게 만들며, 오디오비주얼 작품이나 공연에서도 유사한 기법을 사용하여 관객의 경험을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관객은 단 순한 관람자를 넘어 작품과 더 깊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예술적 경험의 깊이를 더할 것이다.
또 하나의 사례로써, 폴란드 화가 조지 스와프 백신스키(Zdzislaw Beksinski)의 회화공간에서도 이러한 감각의 현상은 일어난다. 백신스키의 회화를 더 심도있게 감사하려면 사실적으로 묘사된 대상을 보는 것 보다 화면에서 제일 먼 곳인 원경 부분 보기를 추천한다. 그는 르네상스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즐겨 사용한 공기 원근법의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한다. 스푸마토 기법은 대기 공기 입자가 쌓여진 밀도의 차이를 통해 먼 곳과 가까운 곳의 공간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전경에 있는 대상보다 저 멀리 감춰진 대상을 짙은 안개로 채워진 공간의 표현으로 인해 우리는 저 너머의 공간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서 생긴 알 기 힘든 빈 공간의 존재로 인해 소리효과를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게 된다. 그 공간은 실존하지 않으면서 (그림 자체는 오디오장치가 없으므로) 관객의 내면에 실존 그 이상의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마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백신스키 화가의 정지해 있는 그림이 가진 효과는 화면 안에서의 시선 고정으로 인해 부재하는 청각신호를 내면으로 존재하게 함으로써 '공간의 청각화'를 가능케 한다는 것이다. 이 화가의 작품들은 표현의 정도에 따라 역설과 강조의 의미까지 나타내는 매력이 있다.

[Untitled (Lone Tree)] (1979) [Untitled (Cathedral)] (1985)
2. 소리를 위한 건축
 1958년 브뤼셀 세계 박람회 필립스관. 르코르뷔제가 설계
1958년 브뤼셀 세계 박람회 필립스관. 르코르뷔제가 설계에드가 바레즈의 Poeme Electonique 에 대한 사례를 들어 오디오 비쥬얼에 있어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고자 한다. 에드가 바레즈의 "Poème Électronique"는 1958년 브뤼셀 세계박람회를 위해 제작된 실험적인 전자 음악 작품이다. 이 작품은 르 코르뷔지에가 설계한 필립스 파빌리온의 독특한 공간에서 상영되었으며, 이 공간은 복잡한 곡선과 비정형적인 형태 로 설계되어 음향 효과를 극대화했다. 필립스관의 독특한 공간모양과 그 안에서 연주되는 소리, 벽에 프로젝션 되는 아프리카 토테미즘의 슬라이드들이 매우 독특한 감각을 체험하게 하였다. 당시의 연주가 현대공연처럼 컴퓨터로 비디오와 오디오가 일치하는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뾰족한 뿔모양의 건축물 내부의 소리 진동과 공간의 울림이 벽에 영사된 사진 이미지와 더불어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Poème Électronique"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멀티미디어 공연이었으며, 음악, 아키텍처, 그리고 시각 예술을 결합한 예술 작업이었다. 음악은 구체음악의 선구자였던 바레즈가 전자 음악의 가능성을 탐구하며 만든 것으로, 그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작곡 기법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소리는 파빌리온 내부의 독특한 형태를 따라 이동하며 공간의 모든 각도로부터 관객 에게 다가갔고,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공간을 새롭게 인지하게 만들었다. 이 공연의 시각적 부분은 건축의 공간과 긴밀하게 연동되었다.
벽에 필름으로 프로젝션된 아프리카 토테미즘의 슬라이드는 음악과 함께 시각적 리듬과 패턴을 만들어내며 관객에게 시청각적인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시각적 요소는 공연의 음향적 요소와 결합하여, 관객이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 어선 경험을 하도록 만들었다. 오히려 움직이지 않는 사진이라서 더욱 그 잔향이 더했을 것을 상상해본다.

파빌리온 내부 공연 기록 사진
한편으로는, 파빌리온의 공간은 혁신적인 음향 경험을 제공했을지언정, 그 당시에는 이를 완벽하게 제어하는 기술이 부족했을 것이다. 현대의 청취 경험과 비교했을 때, 바레즈의 작품은 정밀한 사운드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음향적 혼란을 야기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는 관객이 각각 다른 청취 경험을 하게 만들었고, 음악적 의도보다는 오히려 공간의 형태에 의해 경험이 좌우되는 문제를 발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컴퓨터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Karlheinz Stockhausen)은 전자 음악과 공간에 대한 그의 작업을 통해 "Poème Électronique"와 같은 공연이 가진 공간적, 음향적, 시각적 복합성을 이해하는데 기여했다. 그는 소리가 공간을 어떻게 변형시키고 관객의 체험을 향상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오디오비주얼을 좀 더 심층적으로 연구 발전 시켰다. 그의 작품 은 전자음악뿐만 아니라, 구체 음악, 시리얼리즘, 그리고 공간 음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악적 시도와 탐구를 하였다. 슈톡하우젠은 특히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이것은 그의 작품에서 오디오비주얼 요소로 자주 나타난다.
3. 오디오에 시간을 담는 행위자들
예전에, 2005년 홍대 앞 이리카페에서는 한달에 한 번 오디오 비쥬얼 공연이 라이브하게 열렸다. 당시 오디오 비쥬얼 공연당시, 자동으로 입력된 소리에 반응하는 것을 30%두고 필자가 소리를 듣고 이미지를 믹싱하는 비율을 70%정도 섞었더니 관중들의 호응도가 무척 좋았던 걸로 기억한다. 그 과정에는 소니 bio노트북의 512RAM의 한계로 딜레이가 많이 발생하기고 하였다. 그건 나름대로 오토마틱한 것에 모든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퍼레이터가 지각으로 한 결과를 가 지고 소리에 대한 긍정과 부정을 같이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요즘은 컴퓨터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반응하는 오디오비쥬얼 일수록 정밀하고 잘 표현이 된거라고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과연 오디오비쥬얼 공연에서 무엇이 좋은 가치의 기준일까?
오디오비주얼 공연에서 사운드와 이미지 간의 상호작용 방식은 공연의 성격과 예술가의 의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자동화된 시스템이 주는 정밀도와 예측 가능성 대신 인간의 지각과 개입을 통해 동적이고 직관적인 결과를 내는 것은 관객에게 더욱 강렬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오디오비주얼 공연에서 매우 정밀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구현될 수 있게 되어, 소리와 이미지가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을 때 관객에게 높은 수준의 몰입감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완전 자동화된 접근법은 예술가의 순간적인 해석이나 개입을 배제함으로써 공연에 생동감을 덜 느끼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필자의 이리카페 오디오 비쥬얼 공연장면
(2005)
오퍼레이터의 직관적인 참여는 공연에 '인간적인' 요소(非 기계적인)를 더한다. 이는 관객에게 더욱 독특하고 예측 불가능한 경험을 제공하며, 이러한 개인적인 감각은 기술적으로 완벽한 동기화만으로는 달성할 수 없는 예술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관객이 소리와 이미지 간의 상호작용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된 다. 큰 극장일 수록 이러한 감각의 구현은 어려워서 종종 연주 장면을 카메라로 담아 큰 화면으로 송출하기도 한다.
알바노토 Alva Noto의 오디오비주얼 공연은 이러한 논의에 훌륭한 사례를 제공한다. 그의 작업은 소리와 시각 예술의 교차점에서디지털과 아날로그의 경계를 탐구한다. 그의 공연은 정밀한 컴퓨터 생성 이미지와 소리를 사용하지만, 공연 중 실시간으로 소리와 이미지를 조작하며 예술가의 의도와 관객의 경험 사이의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특히 알바노토와 류이치 사카모토(坂本龍一)와의 오래된 협연 역사는 소리가 시간의 흐름에서 담겨지는 과정을 탐닉하는 두 아티스트의 내면의 세계를 담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실천은 오디오비주얼 아트가 단순히 기술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넘어서, 공연 중, 인간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는 공연이 단지 관람되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예술가가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만들어내는 경험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 들의 손 앞에 놓인 악기 연주를 일일이 쳐다보는 것보다 서로 간의 주고받는 소리 시간의 간극이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요소이다.

알바노토와 류이치 사카모토의 협연 장면
결국, 오디오비주얼 공연에서 '연주의 탁월함'의 기준은 주관적으로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각 예술가와 관객이 가치를 두는 요소에 따라 변화한다. 이 때, 오디오를 분석하는 정밀한 구현 기술(프로그램)과 인간의 직관적 참여 사이에서 어떤 평균을 유지하는 균형을 잡아주는 영역을 찾는 것 이 중요하며, 이러한 균형은 공연이 갖는 예술적 깊이와 관객에게 전달하는 경험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과 설치, 관객이 느끼는 오디오 환경은 오디오와 시각의 경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환경 특성이 없으면 오디오비주얼은 단순한 기술 서비스로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환경이 잘 구성되면 오디오비주얼 아트로서의 의미가 창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매체 자체, 즉 예술 작품을 전달하는 방식이 메시지의 중요한 부분이 되며, 오디오비주얼 아트의 경우, 공간은 매체의 일부로 작용하면서 공간의 구성과 특성은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디오비주얼 아트가 단순한 서비스 기술을 넘어 예술적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관객의 시각적 영역을 채우는 공간과의 더 깊은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이는 환경이 소리와 이미지가 관객에게 전달되는 방식을 변화시키며, 이는 관객의 감각적 경험과 작품에 대한 해석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소 동떨어질 수 있지만 이 시점에서 프랑스 철학자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의 "공간의 생산" 이론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 르페브르는 공간이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생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공간이 단순히 인간 활동을 위한 수동적인 배경이나 '그릇'이 아니라 사회적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생산되고 구축되어 한다고 바라보는 입장이다. 그 이유는 르페브르가 주장하는 공간이 바로 가치와 사회적 의미의 생산에 의해 영향을 받는 복잡한 사회적 구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르페브르의 말을 빌리자면, 오디오비주얼 아트에서 공간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예술 작품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설치 예술에서 언급되는 'site-specific' 개념도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예술 작품이 특정 장소의 역사, 문화, 물리적 환경과 깊게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오디오비주얼 아트에도 공간적 측면에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작품이 그 장소의 특성을 반영하고 상호작용한다면, 이는 관객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 수 있게 된다.
오디오비주얼 아트의 예술적 가치는 기술적 실행을 넘어서 공간과의 상호작용 및 관객이 경험하는 '현장성'과 '존재감'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상호작용은 관객에게 예술 작품이 단순한 경험을 넘어서 깊은 반응과 개인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리를 담아내는 공간 자체는 오디오와 비주얼이 상호작용하는 무대로서 그 크기, 형태, 재질 등이 사운드의 반향과 퍼짐 방식에 영향을 미쳐 비쥬얼의 전달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는 관객이 사운드를 인지하는 방식을 결정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공간의 특성은 비주얼이 어떻게 관객에게 전달되는지도 결정한다. 예를 들어, 공간의 형태에 따라 프로젝션 맵핑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오디오 비쥬얼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정 공간에 오디오와 비주얼은 시청각적 요소를 넘어서 관객에게 보다 현실감 있고 몰입도 높은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관객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보다 창의적이고 복합적인 감각적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오디오와 비주얼을 조화롭게 결합하는 것은 관객에게 보다 풍부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는 관객이 단순히 보고 듣는 것을 넘어서, 공간 자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예술 작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종류의 상호작용은 관객으로 하여금 더 깊은 감정적, 인지적 반응을 경험하게 하며, 예술 작품의 메시지를 더욱 강력하게 전달할 수 있다.
[1] https://smarthistory.org/the-pantheon/ [2] https://youtu.be/FIv6mC4-SEg 1970년 오사카엑스포 파빌리온 소개영상 [3] https://www.cined.com/behind-the-spheres-one-of-a-kind-18k-big-sky-camera/ [4] https://www.youtube.com/watch?v=A-1ICkrXu-Y [5] https://youtu.be/v3uRvJcM3z8 [6] 장세룡. (2006). 앙리 르페브르와 공간의 생산: 역사이론적 ‘전유’의 모색.역사와경계,58, 293-325. |
☆Donation:

Cost of Sojourn: Survival and actions revealed in unspecific sites

London Design Festival 2023

Poetry and Performance. The Eastern European Perspec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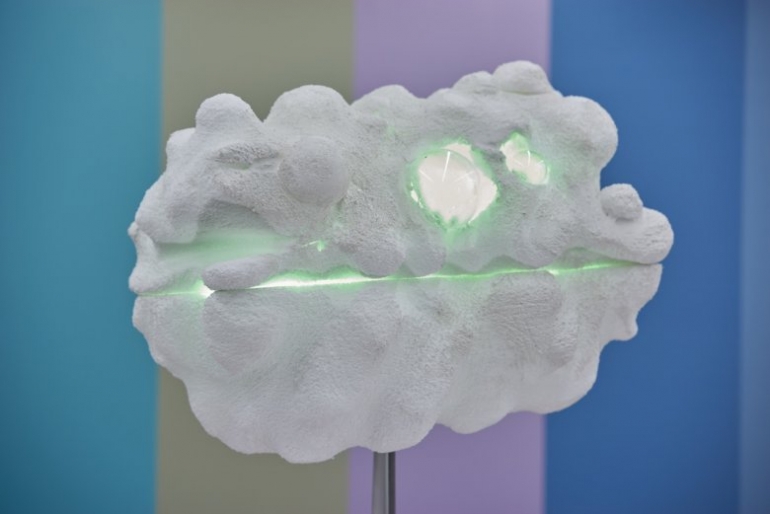
Goyoson: not him, but them and Michel

Tilda Swinton Pays Tribute to the Films of Pier Paolo Pasolini

Stop Painting

Ryoji Ikeda

Performa Biennial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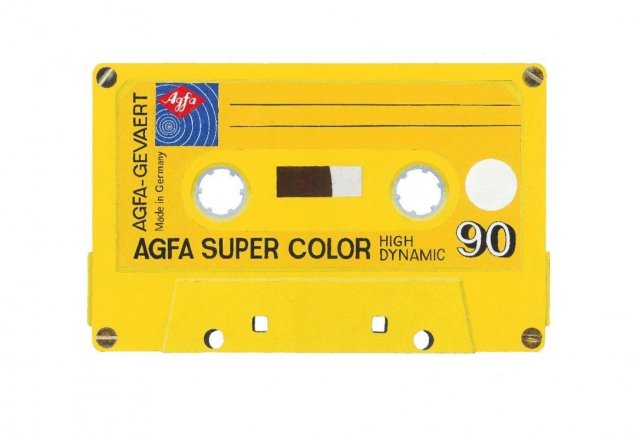
Horace Panter Cassettes 2021
*Art&Project can be registered directly after signing up anyone.
*It will be all registered on Google and other web portals after posting.
**Please click the link(add an event) on the top or contact us email If you want to advertise your project on the main page.
☆Donation: https://www.paypal.com/paypalme2/artlect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