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벽’이 생겼다. 벽이란 건 원래 어떤 공간을 구분 짓는 경계이자 어떤 건물에 종속되어 잠시 빌려 쓸 수 있는 2차원의 공간이라고 생각했다. 작품을 거는 순간, 또는 작품이 걸릴 가능성이 생기는 순간에 벽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걸 모르던 시절에는 벽 옆에 붙어 앉아 있는 것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집에 있는 벽의 벽지 무늬를 하염없이 쳐다보기도 했고 차가운 바깥쪽 벽에 손이 닿으면 화들짝 놀라기도 했다. 계단 옆의 거칠 거칠한 벽은 가죽 가방이 쓸려 흠집이 날까 조심해야 하는 대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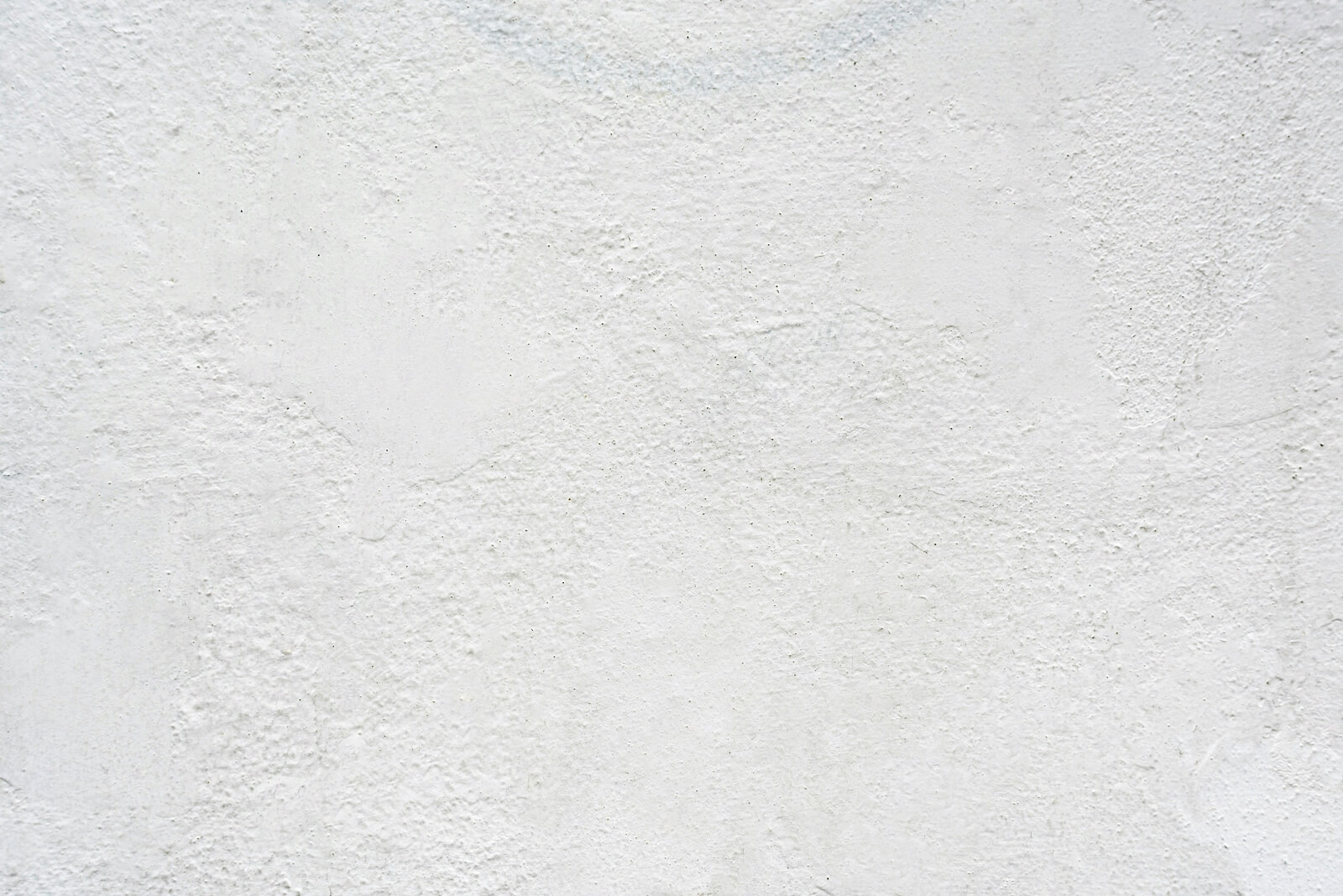
미술을 공부하면서 벽이 경계임과 동시에 하나의 화면이자 공간이 된다는 것을 배웠다. 빛과 그림자를 제외하면 어떠한 색도, 형태도, 무늬도 사라진 채 현실과는 동떨어진 시공간을 만들어내는 미술관의 새하얀 벽 가운데 둘러싸여 있자면 왜인지 오를 중압감과 허무함, 편안함을 느꼈다.

이 벽들은 때로는 학교의 것이었고 때로는 미술관이나 갤러리, 스튜디오의 것이었다. 그동안 수많은 남의 벽들에 못을 박고 나의 작업이나 남의 작업을 걸었다. 약속한 기간이 끝나고 나면 걸어두었던 작업을 도로 내리고 벽에 박힌 옷을 뽑았다. 못이 있었던 자리에 난 구멍은 퍼티로 막고 퍼티가 마르면 사포질을 했다. 약간 어두운 색으로 남은 자국은 새하얀 페인트를 덮어 칠해서 감쪽같이 숨겼다. 페인트까지 마르고 나면 여기저기 뚫려 있던 구멍들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있다.
그랬는데 이제 내 벽이 생겼다. 내가 직접 만들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심고 키워 누군가가 벤 나무를 누군가가 가공하고 잘라서 이어붙이고 깔끔하게 칠하도록 주문했다. 내가 원하는 크기와 두께로 벽을 만들었다. 그 크고 무겁고 새하얀 벽이 내 것이 되었다.

이제부터 나는 이 벽을 가지고 공간을 구분 지을 수 있다. 바닥에서 천장으로 향하는 납작한 공간에 원하는 것을 넣을 수 있다. 여기에 못을 박았다 뽑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얗게 덮어 모른체하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 벽이 주는 중압감도, 허무함도, 편안함도, 그 어떤 느낌과 감정도 가질 수 있다. 현실 세계와 동떨어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시공간도 소유할 수 있다.
공간이나 경계를 소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용하며 불가능한 일인가?